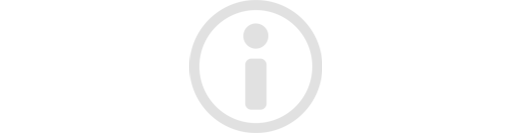
[메트로신문] (왼쪽부터) 우리은행 본점, IBK기업은행 본점./우리은행
민영화 우리은행, 이광구 체제로 2년 만에 지주사 회귀…기업은행, 지주사 전환 위한 컨설팅 시작
국내 은행업이 저금리 기조와 국내외의 불안정한 금융환경으로 위기를 맞았다.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금융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올해 키워드로 정하고 '성장'에 방점을 둔 전략 구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올 은행업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주>
국내 6개 대형은행 중 금융지주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2017년 금융지주사 전환을 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통해 수익성·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 3분기 금융지주사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들 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국내 1호' 지주사 회귀하나
3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절차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16년 만의 민영화와 더불어 민선 첫 은행장으로 이광구 행장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우리은행의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00년 말 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된 후 국내 첫 금융지주사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3년 지주사가 비용만 드는 '옥상옥' 구조여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행장은 지난 25일 연임이 확정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영화 후 첫 번째 과제는 금융지주사 전환"이라며 과점주주 사외이사들도 지주사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는 비은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은행의 자회사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FIS, 우리펀드서비스 등 7개사다.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비은행 계열사가 취약한 상태다.
이 행장은 "자산운용사, 캐피탈, 부동산 관리 회사 등 작은 회사부터 먼저 인수한 뒤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M&A(인수·합병) 시도를 예고했다. 우리은행은 우선 과점주주인 증권·보험사와 제휴해 복합점포를 만들거나 상품 라인업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주사 전환을 통해 재무 건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해체 후 카드와 종합금융 등 위험자산 계열사를 은행 자회사로 두면서 자본비율이 낮아진 바 있다. 우리은행의 작년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업은행, 지주 전환으로 비은행 비중↑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정부 지분을 덜어낸 우리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정부 지분 51%) 특성상 금융지주사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도진 행장이 취임하면서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 행장은 취임식에서 "기업은행은 금융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하지 못하는 등 시너지를 내는 데 제한이 많다"며 금융지주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IBK기업은행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 은행법상으로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금지돼 있는 데다 M&A를 통한 비은행 계열사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은행 체제로서는 경쟁에 한계가 있기 때문. 기업은행은 지주사 전환과 함께 주요 계열사의 대형화, 고객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계열사 시너지 효과 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3월까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지주사 전환의 틀을 짤 예정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증권, 보험, 캐피탈, 중국유한공사 등 자회사 8곳을 갖고 있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기업은행을 포함한 계열사 9곳을 통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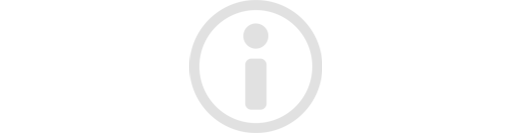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