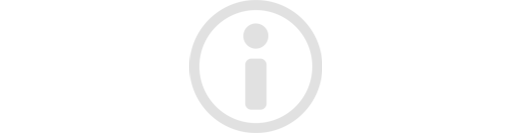
[메트로신문] 은행지주사 업종별 이익 구성 현황자료=금융감독원*흑자를 시현한 업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하여 업종별 비중 산출2014년 상반기:은행부문 56.9%, 비은행 20.4%, 금융투자 9.9%, 보험부문 3.4%, 기타 9.4 15년 상반기 :은행부문 67.1%, 비은행 19.8%, 금융투자 8.1%, 보험부문 5.0%
종종 눈으로 보면서도 현실을 외면한다. 그사이 손 쓸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고 만다. 한국 금융지주사 성장의 전제조건이었던 은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저금리와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덫에 갖힌 것이다. 영국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가 선정한 '2015 글로벌 1000대 은행 순위(기본자본 기준)'에서 50위권에 든 국내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은행의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도 불만이 없을 정도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위스나 싱가포르 은행처럼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덩치 커진 은행 내실은?
국내 은행 지주사의 외형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연결기준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은행지주사의 연결기준 올 상반기 순이익은 4조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0% 감소한 금액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지주사-은행 간 합병으로 해산한 우리지주, 씨티지주, 산은지주의 지난해 상반기 실적을 제외하고 8곳만 비교해 보면 25.2%(8265억원) 늘었다.
지주의 밥그릇은 은행이 챙겼다.
업종별 순이익 구성은 은행부문이 67.1%로 가장 컸고 비은행(19.8%), 금융투자(8.1%), 보험(5.0%) 순이었다.
문제는 은행 영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지주사 총자산의 80% 수준인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1%였다. 5% 이상의 ROA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금융연구원이 2013년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은행의 주요 경영성과를 국내 은행과 비교한 결과, 국내 은행들은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에서 해외 은행들보다 크게 뒤처졌다. 글로벌 100대 은행의 ROA는 평균 0.8%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국 은행 평균 ROA(0.82%)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수 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벗어나고 있다. 반면 국내 4대 은행의 ROA는 최하위권에 속했다.
국내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 영향을 덜 받는 비(非)이자이익의 비중도 다른 해외 은행보다 적었다. 국내 은행과 자본금 규모가 비슷한 해외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국내 은행의 20%보다 두 배 정도 많은 40% 안팎이었다.
◆변화를 두려워 말라
이 같은 구조적 부진은 킬러 콘텐츠 개발과 변화를 두려워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소비자의 자산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 상품만으로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증권, 보험 등 비은행상품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해외 진출과 금융서비스 수수료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내 은행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글로벌 은행 대비 규모의 열위를 극복하려면 스위스나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을 산업이 아닌 공공재로 여기는 금융당국과 정부도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관치의 잔재가 은행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 최근 논란이 된 은행 영업시간, 안심전환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개혁의 첫 대상은 관치가 돼야 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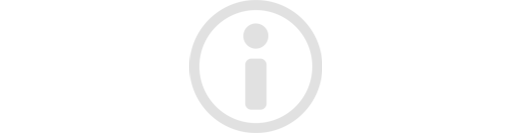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